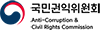[겨를]4·3 제주는 살아 있다
페이지 정보

본문
4·3이라는 ‘사건’의 기억을 타자와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사건이 먼저 이야기되어야 한다. 제주 4·3은 현기영의 <제주도우다>,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의 <화산도>, 시인 김시종의 시집과 자서전 <조선과 일본에 살다> 등을 통해 문학적으로 재현되었다.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,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.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에 일어난 4·3은 정상성으로 되돌려야 하는 ‘법-체제’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띤다. 그러므로 제주 4·3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5·18 광주가 그렇듯이 여전히 숙제라고 할 수 있다.
제주4·3평화재단이 주최하고, 제주민예총이 주관한 전야제 <디아스포라, 사삼을 말하다>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품은 기획이었다. 제주 4·3이 어느 정도 진상 규명되는 데에는 김석범의 <까마귀의 죽음>(1957) 이후 지금껏 재일 디아스포라, 즉 김석범과 김시종 같은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기억투쟁이 역할을 했다. 김시종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제주민예총 김동현 이사장이 대본을 써서 지난해 초연한 뮤지컬 <4월>(작곡 정원기, 연출 왕정민)은 4·3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라고 부를 만했다. 극중 삽입된 스무 곡의 곡 중 <탄압이면 항쟁> <너는 시를 쓰고 나는 너를 읽고> 같은 곡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자 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.
뮤지컬 <4월>은 ‘새 나라, 새 땅, 하나의 국가’를 바랐던 제주 사람들의 강렬한 염원이 해방공간에서 좌절되는 과정을 다룬다. 김동현의 말처럼 4·3은 법의 선포와 법의 정립을 둘러싼 대결이었다. 작중 ‘승진’은 4·3 때 일본으로 밀항해 이제 90대가 된 재일조선인 시인이다. 그는 70여년 전 제주에서 헤어진 애인 ‘정순’이 제주4·3평화공원 행불자 묘역에 묻힌 것을 뒤늦게 알고, 묘역을 찾아 깊은 회상에 잠긴다. 그렇듯 <4월>은 갈 수 없어도 가야만 했고, 날 수 없어도 날아야 했던 재일 디아스포라의 비극적 운명을 상징하는 작품이다. 김시종이 시 ‘봄’에서 봄은 장례의 계절입니다라고 쓴 것도 무리는 아니다.
4·3 전야제에서 확인한 것은 디아스포라 아트의 가능성이었다. 곡 완성에 6년이 걸렸다는 재일 뮤지션 박보의 <제주4·3> 공연은 폭발적인 창법으로 해방감을 선사했다. ‘미스터 낙천’이라는 애칭이 있을 만큼 박보 밴드의 공연은 디아스포라가 더 이상 ‘고향 상실자’가 아님을 역설했다. ‘재일’이라는 중력 안에서도 능동적으로 재일을 살았던 재일 디아스포라 아트가 우리 사회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제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소수자 해방의 논리와 감정을 한데 끌어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. 아직 4월이 가지 않았다.
자녀 세대에 무엇을 상속할까
세상을 담는 방법
해피 버스데이!
- 이전글갤러리사이트 24.04.16
- 다음글������Ƽ�ϱ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մϴ�. 24.04.16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